'한국인은 밥심'이라는 말이 있다. 식습관이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평소에 하루에 한 끼 밥을 먹을까 말까 한 사람들도 외국에 나가면 '한국인은 밥심'을 외치며 밥을 찾는다. 말 그대로 '밥'만 먹으면 되는 거라면 해결은 쉽다.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는 고유의 쌀밥 요리가 있어서 쌀밥을 먹기가 상상하는 것만큼 어렵지는 않다. 하지만 그 나라의 쌀밥을 먹는다고 해도 여전히 밥심이 나지 않을 수도 있다. 쌀밥은 지역마다 조리법도, 쌀의 품종도 다르기 때문이다. 이번 솜대리의 한식탐험에서는 세계 각국의 쌀과 쌀밥을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려 한다.

쌀은 밀, 옥수수, 보리와 함께 인류의 대표적인 열량 공급 작물이다. 쌀은 단위 면적당 생산량이 높아 선호도가 높은 작물이다. 중국 남부, 동남아 북부, 인도 서부 등 아시아 일부 지역에서 재배하기 시작한 쌀은 아시아 대다수의 지역으로 퍼져 나갔다. 현재 쌀은 아시아 대다수 지역의 주식이다. 전 세계 쌀 생산량의 90% 이상은 아시아에서 나온다. 다만 쌀은 강수량이 많고 따뜻한 기후에서만 잘 자란다. 그래서 아시아에서도 날이 춥거나 건조한 지역에서는 다른 곡물을 주식으로 삼는다. 한반도 북부만 해도 쌀보다 조, 기장 등 잡곡을 먹는다. 아시아 외에 남미, 아프리카 일부에서도 쌀을 일상적으로 먹는다.

가루를 내서 면이나 빵으로 가공해 먹는 밀과 달리, 쌀은 모양 그대로 익혀 먹는 경우가 많다. 두 가지 곡물의 특성 차이 때문이다. 밀은 껍질이 알곡과 잘 분리되지 않아서 먹을 수 없는 껍질을 분리해 내기 위해서 밀을 통째로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이 우리가 밀밥을 접할 수 없는 이유다. 반면 쌀은 껍질이 비교적 잘 벗겨지기 때문에 굳이 갈아내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쌀은 가루를 내더라도 점성이 없어 반죽을 하기 어렵지만, 밀가루는 글루텐이라는 점성이 있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어 면, 빵 등으로 가공이 수월하다. 이러한 특성 덕분에 쌀은 모양 그대로 익혀서 쌀밥으로, 밀은 가공해서 빵이나 면으로 먹는 방법이 발달했다.

우리나라도 쌀은 주로 쌀밥으로 먹는다. 2000년이 넘도록 쌀을 주식으로 삼고 있지만, 주요 조리법은 쌀밥이었다. 쌀밥이 한식에서 차지하는 지위는 절대적이었다. 우리 밥상의 중심은 밥이었다. 이름부터가 밥상이다. 반찬과 국은 밥맛을 돋우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었고, 그마저도 세월에 따라 변해왔지만 밥만은 변하지 않았다. 조선시대 밥상 사진을 보면 밥그릇이 지금의 국그릇보다 훨씬 크다. 그 위에 말 그대로 고봉, 높은 봉우리처럼 밥을 쌓아서 먹었다. 한국에서 밥은 하나의 요리인 동시에 식사 자체를 뜻하기도 하고, 안부를 묻는 수단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밥하면 쌀밥이었다. 최근까지 쌀은 항상 부족했다. 일상적으로 흰쌀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일부 상류층 뿐이었다. 하지만 모두가 쌀밥을 먹기 위해 꾸준히 노력했고 끊임없는 생산력 향상으로 결국 20세기 후반에 들어서 그 꿈을 이루었다.
한국에서 생각하는 맛있는 쌀밥은 윤기가 흐르고 찰기가 있는 밥이다. 하지만 이런 밥을 즐기는 곳은 한국과 일본, 중국 동북지역 그리고 대만 정도다. 우리가 먹는 쌀은 자포니카라는 품종이다. 단립종(길이가 짧은 쌀)의 대표적인 품종으로 찰기가 많은 게 특징이다. 자포니카가 전 세계 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에 불과하며 나머지 90%는 장립종(길이가 긴 쌀)이 차지한다. 우리가 흔히 안남미라 부르는 이 쌀은 찰기가 없으며 단단하다. 한국 쌀밥은 솥에 물을 딱 맞게 넣고 짓지만, 장립종은 밥을 물에 넣고 끓인 후 물을 따라내는 식으로 밥을 한다. 유럽에서도 단립종의 쌀을 먹지만 자포니카보다 찰기가 덜하며, 조리할 때 기름을 같이 써 찰기를 줄인다. 단립종과 장립종도 여러 가지로 나뉘어, 쌀의 품종은 수만 가지에 이른다.

지역마다 사용하는 쌀의 품종도, 쌀밥의 형태도 다르다. 풀풀 날리는 장립종 쌀을 먹는 동남아 지역은 우리보다 볶음밥을 많이 먹는다. 볶음밥 중 유명한 것으로는 인도네시아의 나시고렝이 있다. 이 단어는 인도네시아어로 밥(나시)과 볶음(고렝)을 합한 것으로 말 그대로 볶음밥이다. 크찹마니스(간장), 삼발소스(고추 소스), 케첩, 뜨라시(새우를 발효시켜 만든 페이스트) 등 각종 소스와 재료를 함께 볶아 만든다. CNN이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 2위로 주목을 끌었으며, 최근에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밥을 할 때 물 대신 다른 액체류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말레이시아의 대표적인 아침 메뉴인 나시르막은 코코넛 밀크를 넣고 지은 밥에 멸치볶음과 땅콩, 각종 소스를 곁들여 먹는 음식이다. 해안가에 흔한 코코넛을 활용한 요리다. 덮밥식으로 밥 위에 각종 재료와 소스를 부어 먹는 경우도 많다. 인도 남부에서도 쌀밥을 주식으로 하는데, 커리를 밥에 얹어 먹는다. 쌀을 볶다가 육수를 부어 익힌 요리 중 우리에게 익숙한 것으로는 이태리의 리조또가 있다. 이태리 북부 롬바르디아 지역은 유럽지역 쌀의 주 생산지이다. 이 지역에서 시작된 리조또는 버터에 쌀을 볶다가 육수를 넣어 익힌 요리이다.

외국과의 교류가 늘면서 외국의 밥 요리도 많이 유입되었기 때문에 위 요리 대부분은 한국에서도 접할 수 있다. 여기에 각종 기술의 발달까지 더해지면서 우리 쌀밥에도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 식당에서는 요리에 따라 다른 쌀을 사용하는 게 더 이상 특이한 일이 아니다. 일반 마트에서도 원하는 쌀의 품종과 도정도(쌀의 껍질을 벗겨내는 정도)를 골라 그 자리에서 쌀을 도정해 주는 서비스를 많이 시행하고 있다. 너무나도 익숙한 쌀밥이지만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 보면 여러 가지 재미있는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 새로운 음식에 도전해 보듯 새로운 쌀과 조리법에 도전해 보는 건 어떨까? 일상적인 식탁에 소소한 재미가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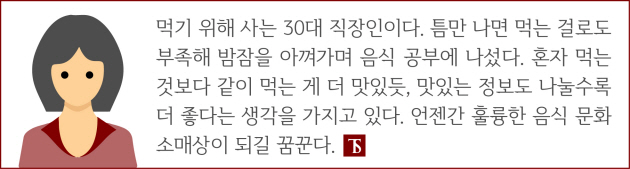
소믈리에타임즈 솜대리 somdaeri@gmail.com
관련기사
- [솜대리의 한식탐험 2] 식품업계의 반도체, 김
- [솜대리의 한식탐험 2] 회, 전통과 세계와 미래
- [솜대리의 한식탐험 2] 글로벌한 젓갈 패밀리
- [솜대리의 한식탐험 2] 떡갈비와 미트볼
- [솜대리의 한식탐험 2] 위스키와 브랜디의 형제, 증류식 소주
- [솜대리의 한식탐험 2] 올리브유와 참기름과 들기름의 관계
- [솜대리의 한식탐험 2] 세계인의 음식, 만두
- [솜대리의 한식탐험 2] 두부와 또우푸와 도후
- [솜대리의 한식탐험 2] 순대 혹은 블러드 소시지 (Blood sausage)
- [솜대리의 한식탐험] 전통 막걸리를 만나다
- [솜대리의 한식탐험] 음식맛은 장맛, 고추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