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맥이나 하러 갈까?"
요즘같이 날이 더워지기 시작하면 부쩍 자주 하는 말이다. 낮에는 더우니 하루 종일 실내에 있다가 저녁이 되면 날씨도 선선해졌겠다 슬슬 나가볼까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럴 때면 생각나는 게 바로 치맥이다.
누구나 좋아하며, (대부분의 경우) 동네에 파는 곳이 있고, 가격도 부담 없다. 치맥, 치킨과 맥주의 조합은 우리 생활 속 깊이 자리 잡아 이젠 단순한 음식의 조합 그 이상이다. 그 증거는 치맥이라는 단어 사용 형태를 살펴봐도 알 수 있다. 보통 '먹다'라는 동사를 쓰는 다른 음식과 달리 치맥은 그 자체가 하나의 의미 단위가 되어 '하다'라는 동사와 주로 함께 쓴다. 심지어 치맥이라는 단어는 외국에서도 통용된다. 구글에서 ChiMac(치맥)을 검색하면 한국의 치맥에 대한 정보들이 검색될 정도이다.
대체 이런 치맥 열풍은 어디서, 어떻게 시작된 걸까?

치킨과 맥주 모두 서양에서 유입된 음식인 만큼 치맥의 역사는 길지 않다. 치킨은 한국 전쟁 이후에야 슬금슬금 그 존재를 알렸다. 주로 주한 미군을 통해서였다. 하지만 일반인들이 치킨을 먹게 된 건 한참 후의 이야기이다.
전쟁 후 가난했던 50년대에는 닭도, 닭을 튀길 기름도 넉넉치 않았기 때문이다. 60년대 양계산업이 활성화되고, 70년대 식용유가 대량 생산되고서야 치킨이 발전할 기반이 마련되었다. 최초의 형태는 소위 말하는 옛날 통닭이다. 시장에서는 닭 한 마리를 통째로 튀겨내어 팔기 시작했다.
70년대에는 최초의 치킨 프랜차이즈인 림스 치킨이 등장했다. 림스 치킨은 닭에 얇은 튀김옷을 입혀 바삭하게 튀겨낸 치킨이었는데, 백화점 지하에 입점한 제법 고급 음식이었다. 80년대에는 치킨이 보다 대중화되고, 양념치킨도 등장하게 된다. 고추장과 물엿, 잼 등을 활용한 양념치킨은 매콤 달콤한 맛으로 대중을 사로잡았다. 페리카나 치킨 등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들이 양념치킨을 기반으로 크게 성장했다.
90년대에는 요즘 많이 먹는 크리스피 치킨이 보편화되었다. 80년대 KFC가 들어오며 소개된 크리스피 치킨은 90년대 BBQ치킨이 생기고 크리스피 치킨을 대표 메뉴로 내놓으며 대중에게 친숙해졌다. 현재의 치킨 메뉴가 모두 개발된 게 불과 30여 년 전이니, 치킨의 위상에 비해 역사가 매우 짧은 셈이다.

역사가 길지 않은 건 맥주도 마찬가지다. 우리나라는 일제 강점기 때 맥주 공장이 처음 생겼다. 일본 맥주 회사인 대일본맥주와 기린맥주가 식민지 조선에 맥주 공장을 설립했다. 해방 후 이 회사들이 민간에 불하되면서 각각 동양맥주(현 오비맥주), 조선맥주(현 하이트진로)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에는 맥주는 소수만 향유할 수 있는 비싼 술이었다. 7~80년대 소득 수준이 올라가고, 80년대에는 맥주 가격도 저렴해지면서 오늘날처럼 대중적인 술이 되었다.
80년대 치킨과 맥주가 모두 보편화되면서 두 음식은 엮이기 시작했다. 두 음식의 조합이 원체 좋았기 때문이다.
먼저, 치맥의 맛 조합은 이미 누구나 알고 있다. 맥주의 탄산은 치킨의 기름기를 잘 잡아준다. 치킨을 먹다 약간 기름지면 맥주를 마셔 입 안을 깔끔하게 해 주고, 맥주를 마시다 입과 손이 허전해지면 치킨을 먹으면서 채워준다. 이렇게 두 가지를 번갈아 가며 먹다 보면, 치킨이나 맥주 한 가지만 먹을 때 보다 치킨도 맥주도 더 많이 먹을 수 있다.
두 번째로, 맥주를 먹는 상황에서 치킨은 딱 맞는 안주거리다. 맥주는 보통 야외에서 혹은 더운 날 시원한 청량감으로 많이 찾는다. 하지만 대개 이런 상황에서 펄펄 끓는 국물 안주나 갓 볶아낸 볶음 안주는 먹기 어렵다. 과자나 마른안주와 먹을 수도 있지만 뭔가 허전하다. 이럴 때 배달도 잘되고, 식어도 맛있으며, 간단히 집어 먹을 수 있는 치킨은 안성맞춤이다. 반대로 야외에서 치킨을 시켜 먹을 때, 시원한 맥주는 딱 어울리는 음료이기도 하다. 이렇게 조합이 좋으니, 치킨과 맥주를 함께 파는 곳은 한 두 군데가 아니었다. 맥주집, 치킨집, 배달음식점, 그리고 스포츠 경기장까지, 모두 치맥을 다루기 시작했다.
이렇게 슬금슬금 조합을 이뤄나가던 치맥은 2002년 월드컵을 거치면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다. 모두 함께 모여 경기를 구경할 때, 넘치는 열기를 시원하게 식혀주는 맥주와 경기에 집중하면서도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치킨은 가장 적합한 음식이었다. 호프집에서 집에서 가족끼리 경기를 볼 때 치맥은 필수품이었다.
그해 여름부터 치맥이라는 단어는 모르는 사람이 없어졌고, 이후 하나의 문화 현상처럼 자리 잡았다. 심지어 치맥 페스티벌도 생겼다. 2013년부터 대구에서 시작된 치맥 페스티벌은 100만 이상이 모이는 초대형 축제가 되었다. 수많은 지자체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축제를 만들어냈지만, 이만큼 성공한 축제는 많지 않다. 수많은 치맥 마니아들이 SNS에서 자발적인 홍보를 벌인 것이 축제의 성공에 큰 영향을 미쳤다.

점차 커진 치맥의 인기는 외국에도 알려졌다. 특히 한류 드라마에서 치맥 먹는 모습이 나오면서 한국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치맥은 필수 코스가 되었다. 여기에 가장 영향이 컸던 드라마는 별에서 온 그대다. 전 아시아적 인기를 끌었던 이 드라마에서 치맥을 하는 장면이 나온 후 치맥이라는 단어는 아시아 전체에 퍼져나갔다. 중국인 관광객 4500명이 월미도에 모여 치맥 파티를 벌이기도 했다.

생각해보면 의아하다. 외국에도 치킨과 맥주는 판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한국의 치맥이 알려지게 되었을까? 물론 여기에는 대표적인 답안이 있다. 우리나라의 맥주 특성 때문이라는 것이다. 아메리칸 라거로 분리되는 우리나라 맥주는 향과 맛이 약하고 탄산이 강하다. 덕분에 치킨의 맛을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치킨의 기름짐을 잘 정리해준다. 하지만 이 것만으로는 설명이 되지 않는다. 아메리칸 라거는 미국, 중국, 일본에도 많고 이 나라에도 치킨은 있다. 하지만 치맥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한국을 대표하는 음식이 되었다.
이는 치맥이 음식의 조합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를 형성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다. 두 가지를 같이 먹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축제까지 하며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는 곳은 우리나라뿐이다.
김춘수의 시 '꽃'에는 이런 유명한 구절이 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원래 있었던 사람이지만 이름을 불러줌으로써(의미를 부여함으로써) 특별해진 것처럼 치맥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우리 음식 문화를 얘기할 때 대부분은 전통 한식이 그 주제다. 하지만 치맥은 여기에 예외를 만들어 주었다. 한국 음식 문화를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면서도, 그 유래도 우리나라가 아니고 역사도 매우 짧고 하나의 음식이 아닌 두 가지 음식의 조합이다. 이런 치맥의 예외성은 우리 음식 문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더 많은 흥미로운 요소들이 우리 음식 문화에 더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치맥이 보여주었다. 치맥의 지난날을 돌아보며 제2, 제3의 치맥이 계속 나타났으면 하고 조심스레 바라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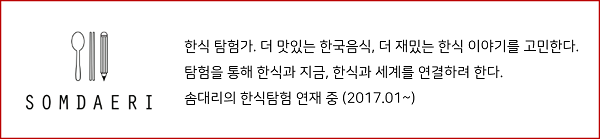
소믈리에타임즈 솜대리 somdaeri@gmail.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