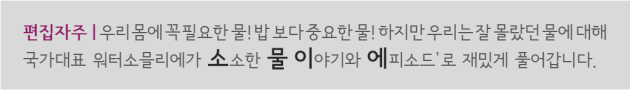
우리나라 먹는 샘물은 거의 페트(PET)병에 담겨 유통된다. 위키백과에서는 먹는샘물의 정의를 “페트병에 담아 파는 물”이라고 올려놓았으며, 대한민국 국어사전에도 같은 뜻으로 등재됐다. 국내의 경우 수입품에 비해 유통구조가 간단하고 이동거리가 짧기 때문에 페트병에서 나오는 좋지 않은 특징들이 덜 드러나는 편이다. 하지만 국내에 들어오는 대부분의 수입품들은 (특히 물은 다른 상품군에 비해 저가이기 때문에) 비행 편이 아닌 선박 편으로 들어온다.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 등에서 들어오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적도를 거쳐 들어온다. 단가 때문에 냉장이 되는 컨테이너에 실지 못하고, 일반 컨테이너에 실린다. 참고로 유럽에서 일본으로 보내는 선박의 경우, 와인병 기준 병당 500원의 가격이 차이가 난다고 한다. 한 컨테이너, 두 컨테이너, 즉 몇천 박스, 몇만 박스의 경우 엄청난 가격 차이가 난다. 적도를 지나는 선박에 실린 컨테이너는 50도 이상으로 온도가 올라간다. 높은 온도는 한 차례 이상 가소제 처리가 된 페트에서 불임을 유발하는 인공에스트로겐 등 건강에 좋지 않은 성분들을 나오게 한다.
플라스틱은 원래 형태상 굉장히 딱딱한 고체 상태이다. 이 플라스틱의 형태 변형을 위해서 가소제를 처리하는데, 이 가소제를 어떤 것으로 쓰느냐에 따라 다른 화학물질과 환경호르몬이 나온다.

페트병은 PET 혹은 PETE로 표기되어 있는데, 본 명칭은 ‘폴리에틸렌 테레프타레이트(Polyethylene Terephthalate)’이다. 보통 플라스틱 물병과 탄산 음료병 등에 많이 사용되는데, 햇빛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환경호르몬이 최고 6배까지 증가한다고도 하고, 원래 일회성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계속 사용하게 되면 환경 호르몬이나 박테리아가 번식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햇빛이 비치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한번 사용하면 재사용은 금지해야 한다.
또한 플라스틱 뚜껑은 HDP 혹은 HDPE 라고 하는 고밀도 폴리에틸렌으로 만드는데, 보통 세제 통이나 올리브 오일 통에 이용된다. HDP는 열에 강한 재질로 인체에 전혀 무해하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플라스틱병이다.
사실 물이 가격이 있는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원가 절감을 위해 PET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생수 무역을 하는 한 업계 관계자는 “유리로 된 물 같은 경우는 파손의 위험이 커 로스율이 높다. 특히 물병이 깨지면 물이 새어나와 같은 박스 내의 다른 물의 라벨을 젖게 하면 치명적이다. 가격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이런 이유로 PET를 선호한다”라고 한다.
이러한 이유로 유리병으로 대체되기 어렵다. PET를 벗어나기 어렵다면 PET에 담긴 물이 안전하게 수원지에서 우리 입까지 올 수 있도록 신경 써야 한다.
편의점이나 마트 앞에 2L 6개 묶음을 직사광선이 비치는 밖에 내놓는다. 장시간 햇빛에 노출될 경우 환경호르몬이 증가할 수 있으니 안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만약 생수를 살 일이 있으면, 꼭 안에 보관된 물을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다.

[칼럼니스트 소개] 김하늘은? 2014년 제 4회 워터소믈리에 경기대회 우승자로 국가대표 워터소믈리에다. 2015년 5회 대회 땐 준우승을 차지하며 연속 입상했다. 다수의 매체와 인터뷰 및 칼럼연재로 ‘마시는 물의 중요성’과 ‘물 알고 마시기’에 관해 노력하고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김하늘 skyline@sommeliertimes.com
관련기사
- [김하늘의 소물이에] <16> "물은 정말 섬세해서 온도에 따라 맛이 달라져요"
- [김하늘의 소물이에] <15> 동양과 서양의 물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 어떻게 다를까?
- [김하늘의 소물이에] <14> 걱정 가득 수돗물의 선택, 수돗물을 안전하게 마실 방법은?
- [김하늘의 소물이에] <13> 스타들의 프리미엄 워터,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은 무슨 물을?
- [김하늘의 소물이에] <12> 캄보디아 여행시 배앓이의 주범, 물갈이
- [김하늘의 소물이에] <11> 물, 언제부터 사마셨을까?
- [김하늘의 소물이에] <10> 칼로리 제일 낮은 물로 주세요
- [김하늘의 소물이에] <5> 탄산수도 이가 썩나요?
- [김하늘의 소물이에] <4> 물과 함께 하는 체질 변화, 알칼리수
- [김하늘의 소물이에] <3> 너도 나도 프리미엄 워터(Premium Water)?
- [김하늘의 소물이에] <2> 컵라면에서 치약 맛이 나요
- [김하늘의 소물이에] <1> 나의 첫 에비앙(Ev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