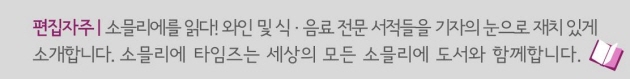

“차의 비싼 가격은 불순물을 넣은 차를 많이 만들어냈다. 최상품 중국 녹차와 비슷해질 때까지 딱총나무 잎이나 서양물푸레나무 잎, 가장 흔하게는 야생자두나무 잎을 끓이고 굽고 말고 말려서 색을 입힌 것이었다. 동록을 넣어 끓인 뒤 말려서 ‘네덜란드 핑크(Dutch pink)’라는 독성 혼합물로 된 염료를 입힌다. 그러고는 다시 더 많은 동록을 넣어 독약이나 다름없는 ‘차’를 만들었다.” - 141쪽
《차의 지구사》(휴머니스트, 2015)는 차가 어디에서 탄생해 어떻게 세계 각지로 퍼져나갔는지 알려주는 책이다. 중국과 서유럽은 물론 한국, 일본, 타이완, 베트남, 미얀마, 티베트, 러시아, 아프가니스탄, 모로코 등 다양한 아시아 지역의 차에 대해 다룬다.
책에 따르면, 1610년 네덜란드인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차를 처음 가져왔다. 차가 처음 유럽에 전해졌을 때 차의 씁쓸한 맛과 건강에 도움을 준다는 특성 때문에 약용 음료로 여겨졌다. 차 값뿐 아니라 차를 마시기 위한 다기도 비쌌던 탓에 차는 상류층에서만 즐길 수 있었다. 네덜란드 상인들은 독일, 프랑스, 영국 등 다른 나라 시장에도 차를 내놓았고, 많은 유럽의 왕들은 자신이 소유한 공원과 정원에 찻집을 직접 만들기도 했다.
또한, 미국은 차보다 커피를 자주 마시지만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저자에 따르면 1775년 영국 정부가 식민지 주민들이 즐겨 마시던 차에 세금을 부과했다. 과도한 세금에 식민지 주민들은 반발했고, 이것은 미국 독립전쟁의 발단이 된 ‘보스턴 차 사건’으로 이어졌다. 20세기 초 미국에서도 애프터눈티 문화가 확산되었고, 금주법으로 알코올음료의 판매가 금지되자 술 대신 차를 마시는 티룸이 유행했다.
이밖에도 책은 한국의 차문화에 대해서도 다룬다. 고려 이후에 한반도에서 왜 차문화가 거의 사라지게 되었는지, 찻잎 대신 다른 재료를 이용한 ‘유사차(類似茶)’가 어떻게 유행했는지, 해방 이후 어떻게 차문화가 다시 우리 사회에 확산될 수 있었는지 한반도 차의 역사를 알려준다. 차의 세계에 발을 들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지식을 넓혀주는 책이다.
오명호 기자 omh4564@sommeliertime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