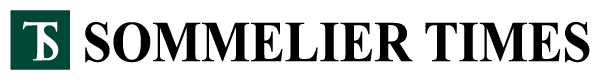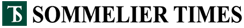조지아의 와인산지는 크게 6개로 분류된다; 카헤티(Kakheti), 카르틀리(Kartli), 이메레티(Imereti), 라차(Racha), 흑해 연안 지역(Black Sea Costal Zone) 그리고 메스헤티(Meskheti). 라차는 다시 2개의 하위 지역(sub-zone)으로 분류되는데, 라차(Racha)와 레츠후미(Lechkhumi)가 이에 해당한다. 조지아 와인산지 지도에는 라차와 레츠후미가 각각 카헤티나 카르틀리와 같은 레벨의 독립적인 와인산지인 것처럼 표시되어 있다. 하지만, 조지아 국립와인에이전시(National Wine Agency of Georgia)는 와인산지로서의 라차와 라차의 하위 지역으로서의 라차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있다. 흑해 연안 지역은 압하제티(Apkhazeti), 사메글레로(Samegrelo), 구리아(Guria), 아드자라(Adjara), 이렇게 4개의 와인산지를 포함한다.
조지아의 와인산지가 9개인가 10개인가 하는 문제는 바로 레츠후미를 라차의 하위 지역이 아니라 라차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와인산지로 인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 조지아 와인을 다루는 문헌이나 웹사이트에서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조지아의 와인산지 숫자를 설명하는 경우를 아직 보지 못했다.

조지아 동부에 있는 카헤티가 가장 대표적인 조지아의 와인산지다. 조지아 전체 포도밭의 77%가 카헤티에 있기 때문이다. 이메레티와 카르틀리가 각각 14%와 5%로 그 뒤를 잇는다. 이메레티가 조지아에서 두 번째로 큰 와인산지이지만, 카헤티의 와인과는 달리 이메레티 와인은 아직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카헤티 와인과 이메레티 와인의 차이
‘고대 조지아의 전통 크베브리 와인 양조법’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조지아가 유네스코에 제출한 공식 문서에는 카헤티와 이메레티에서의 크베브리(Qvevri) 와인 양조법을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다.
“조지아 동부 – 카헤티의 방식: 포도즙을 차차(chacha, 포도 껍질, 줄기, 씨)와 함께 5개월~6개월 동안 발효, 숙성, 보관한다.
조지아 서부 – 이메레티의 방식: 크베브리 안에 포도즙과 차차의 일부(2.6%)를 넣어 발효시키다가 11월에 차차를 제거하고, 와인을 밀봉된 크베브리 안에 두어 봄까지 숙성시킨다.”
카헤티의 와인과 달리 이메레티에서는 크베브리 앰버 와인을 만들 때 차차를 훨씬 적게 넣고, 침용 기간도 짧게 한다는 것은 이해하겠는데, 2.6%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궁금증이 생겼다. 또한, 차차에 줄기(stalks)도 포함된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서 카헤티에서는 줄기를 반드시 크베브리에 넣는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다. 실제로 카헤티에 가서 와인 생산자들에게 물어보면 줄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고대 혹은 아주 오랜 과거에는 줄기까지 모두 양조에 사용했을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
국제와인기구 OIV는 2020년에 결의한 OIV-ECO 647-2020을 통해서 침용 과정을 거친 화이트 와인(White wine with maceration)을 Special Wine의 카테고리에 포함시켰다. 그런데 최소 침용 기간을 1개월로 정했다. 이 결의안은 2017년에 조지아 정부가 신청한 것을 바탕으로 채택된 것이다. 여기에서 조지아 정부가 이메레티식 크베브리 와인 양조법도 고려한 것을 쉽게 알 수 있지만, 2~3주 정도의 침용 과정을 거친 오렌지 와인이 세계적으로 적지 않게 생산된다는 것을 고려하면, 최소 침용 기간을 1개월로 정한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카헤티와 이메레티는 재배하는 포도 품종에서도 차이가 있다. 카헤티에서는 화이트 품종으로 르카치텔리(Rkatsiteli), 므츠바네(Mtsvane), 키시(Kisi), 히흐비(Khikhvi), 레드 품종으로 사페라비(Saperavi)를 주로 재배한다. 반면에 이메레티에서는 화이트 품종으로 치츠카(Tsitska), 촐리코우리(Tsolikouri), 크라후나(Krakhuna), 레드 품종으로 호츠하누리 사페레(Otskhanuri Sapere)를 주로 재배한다.
필자는 이러한 사전 지식에 약간의 궁금증을 안고 지난 10월에 이메레티를 방문했다. 2018년에 처음으로 조지아의 땅을 밟은 이후 일곱 번째 조지아 방문인데, 이메레티에는 처음으로 가게 되었다.
이메레티에서의 경험
이메레티를 방문한 계기는 이메레티에서 생산된 와인만 출품될 수 있는 Imeretian Wine Challenge라는 와인품평회에 영광스럽게도 심사위원으로 초청받은 것이었다. 현지에서 다양한 이메레티의 와인을 시음하고, 또 와이너리와 문화 공간을 직접 경험하면서 필자는 조지아 와인의 스펙트럼이 얼마나 넓고 다채로운지 다시 한 번 깊이 깨달을 수 있었다. 또한 이메레티는 조지아 와인의 ‘두 번째 심장’이라 불릴 만큼 개성이 있고 섬세한 와인들이 태어나는 곳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메레티는 조지아 서부, 흑해와 가까운 내륙 분지 지역으로 쿠타이시(Kutaisi)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비교적 온화하고 습한 서부 조지아 특유의 기후를 갖고 있다. 강우량이 많고, 여름은 덥고, 겨울은 카헤티보다 온화하다. 점토와 석회질이 섞인 다양한 토양이 존재하는데, 구릉지대와 강 유역이 많아 포도 재배에 적합하다.
카헤티와 함께 이메레티는 조지아 전통 와인의 중요한 거점 중 하나다. 고대부터 전통 크베브리 양조가 발달했지만, 카헤티와는 스타일이 뚜렷이 다르다. 카헤티에서는 포도껍질, 씨, 때로는 줄기를 모두 장기간, 보통은 6개월 동안, 침용시키는 반면, 이메레티는 보통 껍질과 씨를 일부만 사용하고 침용 기간도 짧다. 조지아 국립 와인 에이전시의 홈페이지에는 침용 기간이 2개월이라고 소개되어 있지만 와인 생산자마다 기간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지에서는 껍질과 씨를 약 30% 정도 사용한다고 설명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유네스코 관련 문서에 어떤 근거로 2.6%라고 언급되어 있는지는 이메레티 현지에서도 풀지못한 궁금증으로 여전히 남아 있다.
이메레티에서는 크베브리를 추리(Churi)라고 부른다. 아주 중요한 사실은 크베브리를 카헤티와는 달리 폐쇄적인 실내 공간의 지하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개방된 공간 또는 반-실내 구조에서 땅속에 놓아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매우 덥고 건조한 카헤티만큼 여름에 열 관리가 필요하지 않고, 양조 스타일이 부드럽고 발효 열이 크게 치솟지 않고, 집 마당과 연결된 개방형 마라니(marani, 와인 셀러라는 뜻의 조지아 용어)가 전통적이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카헤티의 크베브리 와인이 구조적이고 타닌이 강하다면, 이메레티의 크베브리 와인은 더 부드럽고 섬세한 스타일을 추구한다. 따라서 음식과의 페어링 범위가 넓다. 또한, 앰버 와인이지만 색조는 밝고, 향은 플로럴하고, 시트러스가 많이 느껴지며, 입안에서는 미네랄리티가 두드러진다.

이메레티는 전통적으로 스파클링 와인 산지로도 알려져 있다. 특히 치츠카를 기반으로 만든 스파클링 와인은 조지아의 새로운 강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오늘날 이메레티는 조지아 와인의 혁신적 중심지 중 하나로 평가받는다. 전통 크베브리 와인뿐 아니라 현대적 스틸 와인, 내추럴 와인, 스파클링 와인까지 다양하게 생산되고 있다. 카헤티가 “전통과 힘”을 상징한다면, 이메레티는 “우아함과 다양성”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앞으로 국제 시장에서 점점 더 주목받게 될 것이다.

박찬준 대표
㈜디렉스인터내셔날 대표이사
Break Events의 한국 대표
와인 강사, 와인 컨설턴트
아시아와인트로피 아시아 디렉터
아시아와인컨퍼런스 디렉터
동유럽와인연구원 원장
한국국제소믈리에협회 부회장(국제협력)
다수의 국제와인품평회 심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