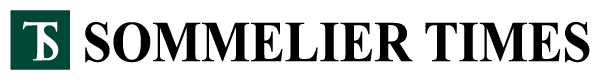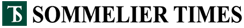와인애호가라면 한 번쯤 들어봤을 와인 속설들이 있다. 오래 숙성해야지 맛있다 혹은 어떤 것을 하면 와인 맛이 좋아진다 등 출처는 알 수 없지만 왠지 모르게 우리 머릿속에 각인된 다양한 스토리들이 존재한다. 과연 우리가 알고 있던 속설들은 진짜일까?
와인은 오래 숙성해야지만 맛있다?

맛없는 생김치가 익으면 맛있어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듯이, 와인도 맛없는 영 와인이 숙성을 통해서 맛이 좋아지지 않는다. 영 와인 때 맛을 보고 “야! 몇 년 뒤에 마시면 아주 좋겠는데~”라는 감탄사가 나와야 한다. 그래서 위대한 와인을 ‘기다림이 미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렇지 않은 평범한 와인은 와인메이커가 가장 맛이 좋을 때 병에 넣으니까 나오는 즉시 마시는 것이 가장 좋다. 이런 와인은 오래 두면 맛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고 점점 맛이 가기 시작한다.
와인을 알기 시작하면 무조건 오래 보관하면 좋아진다는 믿음으로, 싼 와인이라도 우리 애가 스무 살이 되었을 때같이 마시겠노라고 고이 보관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값싼 와인은 오래 두면 맛이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얼마 있지 않아 맛이 변하게 된다. 즉 겉절이를 아무리 오래 두어도 묵은 김치가 될 수 없는 원리나 마찬가지다.
묵은 김치는 오래 보관하기 위해서 짜고 진하게 담그고, 온도가 일정한 땅속에 저장한다. 와인도 마찬가지로 오랜 시간 숙성시켜 깊은 맛을 내는 와인은 장기간 숙성에 적합한 품종을 선택하고, 레드와인의 경우 껍질과 함께 침지 시키는 시간(SCT)을 길게 하여 껍질과 씨에서 우러나오는 타닌 성분을 증가시키고 아울러 색소도 많이 추출되도록 배려한다. 그래야 오래 두어도 맛이나 향이 변질되지 않고 오히려 더 나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디캔팅 과연 효과가 있을까?

디캔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침전물을 제거에 있다. 이 찌꺼기는 입안에서 나쁜 감촉을 주며 쓰거나 떫은맛을 내기 때문에 와이너리에서는 이런 찌꺼기를 미리 제거하여 병에 넣지만, 오래 보관한 레드와인은 침전물이 가라앉아 있을 수 있음으로 이러한 와인을 접대할 때는 침전물을 제거할 수 있는 디캔터(Decanter)를 미리 준비하여, 침전물을 제외한 맑은 와인을 조심스럽게 디캔터로 옮긴 후에 글라스에 따라 마신다. 그래서 촛불을 켜서 병목에 침전물이 딸려 나가는지 살피는 것이다.
그러나 요즈음은 디캔팅을 하면 와인이 공기와 접촉하여 향미가 훨씬 더 좋아진다는 통념에 따라 레스토랑이나 바에서 디캔팅을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졌다고 한다. 숙성이 덜 된 거친 와인을 공기와 접촉하면서 맛이 부드러워진다는 것인데, 과학적으로 따져 봤을 때 와인을 미리 개봉하거나 디캔팅 하여 바람직한 향이 증가한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30분이나 1시간가량의 짧은 시간에 무슨 화학반응이 일어나 우리가 인식할 만한 좋은 향이 나올 수 있을까? 오히려 디캔팅 한다면 바람직한 향이 유실될 우려가 훨씬 더 많다.
물론 바람직한 변화도 있을 수 있다. 병안에 나쁜 향이 가득 차 있을 경우는 그 향이 없어지니까 좋게 느낄 수는 있다. 그리고 이런 조작을 하는 동안 셀러에서 꺼내 올 때보다 온도가 더 올라가서 쓰고 떫은맛을 덜 느끼기 때문에 와인이 부드럽게 느껴지는 것도 감안해야 한다. 그러나 오래된 고급 레드와인을 공기와 활발하게 접촉시키면 오히려 급격하게 그 질이 떨어질 수 있다. 정말로 공기와 접촉하여 와인 향이 더 좋아진다면 차라리 와인을 잔에 따르고 난 다음에 흔들어 주는 것이 공기 접촉이 더 활발하게 일어날 것이다.
공기와 접촉시킨다면서 쓸데없이 냄새나는 촛불은 왜 켜놓고, 공기를 불어 넣어준다면 와인을 콸콸 거칠게 부어야지 왜 명주실 뽑듯이 가늘게 디캔팅 하라고 강조하는 것인지 곰곰이 따져보면 그 답이 나올 것이다. 디캔팅은 쇼일뿐이다. 디캔팅을 하면 손님은 귀빈 대접을 받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지고, 그에 따라 와인 맛도 좋게 느끼는 것이다. 와인은 그 자체의 맛보다는 누구랑 언제 어디서 마셨는가에 따라서 맛이 좌우되기 때문이다.
병 똥구멍(펀트/Punt)이 깊어야 좋은 와인?

와인을 아는 척하는 사람들의 그럴싸한 거짓말 중에 “병 똥구멍이 깊어야 좋은 와인이다”라는 그야말로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있다.
병이야 사람이 만들기 나름이지 병 모양이 와인의 품질을 좌우할 수는 없다.
이 부분을 ‘푸시업(Pushup)’, ‘펀트(Punt)’ 등으로 부르는데, 원래 이 구멍은 병을 불어서 만들 때 병의 모양이 형성되고 나서 끝부분에서 튀어나온 날카로운 부분이 테이블에 상처를 줄까 우려해서 안쪽으로 집어넣으면서 생긴 것이다.
이렇게 만들면 병을 세웠을 때 안정성이 있고, 샴페인의 경우는 강한 압력에 견딜 수 있는 구조가 된다. 펀트가 깊을수록 좋은 와인이란 말은 전혀 근거 없는 소문이다.
병 바닥을 이렇게 푹 들어가게 만들면 부피가 줄어든 만큼 병을 더 크게 만들어 동일한 용량의 다른 병보다 훨씬 더 크게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와인의 품질과 무관하다.
질 나쁜 와인을 만들면서, 제병업자에게 병 바닥을 깊게 파 달라고 부탁하면 어떻게 될까?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금방 알 수 있는 데도 이를 믿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은 것이 사실이다.
또, 병 바닥에 찌꺼기를 모으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와인 따를 때 침전물이 오히려 더 흐트러져서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눈물(Tear, Leg)이 많을수록 좋은 와인이다?

와인이 담긴 잔을 흔든 다음에 그대로 두면, 얇은 막이 형성되어 눈물같이 밑으로 흘러내리는데, 이것을 ‘Legs’, ‘Tears’, 혹은 ‘Arches’라고도 한다. 이 현상을 ‘마랑고니 효과(Marangoni effects)’라고 하는데, 영국의 물리학자 ‘제임스 톰슨(James Thomson)’이 이미 1855년에 이 현상을 정확하게 설명했다고 한다.
와인이란 화학적인 성질 즉, 증발율과 표면장력이 다른 알코올과 물의 혼합물로서 이루어져 있어서, 와인 잔을 흔들면 잔 벽에 와인의 얇은 막을 형성된다. 이 엷은 막 표면에서 알코올이 먼저 증발하기 때문에, 그 밑에 있는 액체보다는 물의 함량이 훨씬 더 많아진다.
알코올이 가장 증발이 잘 되는 곳은 유리와 액이 닿는 끝부분 즉 반달 모양의 메니스커스 꼭대기의 공기/액체/글라스의 경계면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물의 농도는 이 부분이 최고가 되며, 표면장력도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중력을 무시하고 글라스 표면에 수직의 표면장력에 의한 막이 형성되지만, 점점 많아지면 막의 꼭대기 부분부터 물방울이 형성되어 흘러내리게 되는데, 지속적으로 이 현상이 반복된다.
그러니까 이 눈물은 주로 물일 수밖에 없으며, 알코올 함량이 높은 와인일수록 안쪽과 바깥쪽의 농도 차이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현상이 잘 일어난다. 알코올 농도가 높은 위스키나 코냑으로 해보면 훨씬 더 잘 된다. 그러나 잔에 세제가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잘 닦아야 한다.
여러 책에서 이 현상의 원인을 와인의 글리세롤 혹은 당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글리세롤의 끓는점은 290℃로서 증기압이 물보다 낮기도 하지만, 와인에 1 % 내외의 적은 양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인 영향력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오래될수록 좋아지는 와인?

오래될수록 좋은 와인이라는 믿음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 자연과학이 와인에 적용되기 전에는 와인의 양조와 보관은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었다. 대부분의 와인은 수확 다음 해 여름을 넘기지 못하였고, 이런 와인은 오래될수록 값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었다. 그러나 몇몇 유명한 샤토에서 나오는 와인은 1년, 2년 더 오래 보관을 해도 맛이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좋아지니까, 이런 와인은 값이 비싼 것은 물론, 명품으로 찬사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즉 와인은 오래될수록 좋은 것이 아니고, 오래되어도 그 맛이 변하지 않는 와인이 좋다는 것이다. 3년 묵은 간장이라면 변질된 것이 아니고 간장의 특성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오히려 깊은 맛과 향을 가진 것이라야 된다.
16-17세기에 프랑스에서 마시는 와인이라고 해야 조악하고 겉보기에도 탁했으며 거칠었고 오래가지 못했기 때문에, 예외가 있긴 하지만, 다음 해 와인을 담그기 전에 모두 마셔야 했다. 즉 와인의 수명은 수십 년이 아니고 1년을 목표로 담그는 것이었다. 그래서 당시에는 보다 투명하고 풍미가 섬세한 와인이 가장 귀한 와인으로 평가받았고, 와인은 다음 해 6월 이전에 모두 소모해야 된다는 믿음이 지배적일 때였다. 이들은 이때를 넘기면 와인의 질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생각했고, 실제로 여름이 되면 와인 질이 떨어지기도 했던 때다. 프랑스 역사학자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은 “1500년대에는 오래된 보르도 와인이 담긴 오크통 하나가 6리브르밖에 안 됐지만, 갓 담근 와인이 담긴 오크통 하나는 50리브르나 되었다.”라고 기술하고 있다.
근대적 와인의 시대가 열린 1600년대 후반부터라고 볼 수 있다. 그때까지만 해도 와인은 다른 작물과 구별되지 않는 농작물에 불과했다. 와인의 생산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으며, 와인 가격은 수확한 해가 지나고 햇와인이 나오면 폭락했다. 이렇게 대부분의 와인은 오래될수록 질이 떨어지는 것이었으나, 특정 지역의 것은 3년, 5년, 10년을 두어도 맛이 유지되는 것이 있었으니, 이들이 오늘날 ‘그랑 크뤼(Grand Cru)’가 된 것이다.

고려대학교 농화학과, 동 대학원 발효화학전공(농학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Freesno) 와인양조학과를 수료했다. 수석농산 와인메이커이자 현재 김준철와인스쿨 원장, 한국와인협회 회장으로 각종 주류 품평회 심사위원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소믈리에타임즈 칼럼니스트 김준철 winespirit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