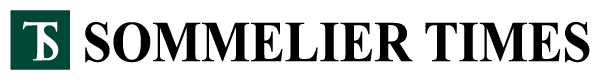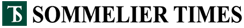어떤 작물이든 기름진 토양에서 자라야 좋은데, 포도나무라고 예외는 아니다. 포도 역시 기름진 토양에서 재배해야 수확량도 많아지고 나무도 잘 자란다. 그러나 와인용 포도는 전통적으로 거친 토양에서 재배를 했다. 기름진 토양에는 주식인 ‘밀’ 심어야지 ‘포도’를 심으면 미친놈 소리를 듣기 때문이다. 주식을 먼저 해결해야 한다. 와인은 안 마셔도 죽지 않는다. 그래서 저 비탈에 있는 놀리기는 아깝고 농사는 안 되는 거친 토양에 포도를 재배하게 되었고, 포도나무는 이런 토양에서 살기 위해 땅 속 깊이 뿌리를 뻗어 저 밑에 있는 수분과 양분을 악착같이 빨아들이면서, 수천 년 동안 이렇게 적응되어 온 것이다. 이렇게 해서 와인용 포도는 자연스럽게 야생에 가깝게 재배될 수밖에 없었고, 그에 따라 수확량은 적지만 향은 훨씬 풍부해진 거니까 식용포도와는 차원이 다른 재배방법이다.
와인의 맛은 절대적으로 포도가 좌우하며, 와인의 품질은 미량 성분인 향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와인용 포도는 바람직한 향이 풍부해야 한다. 식물이 분비하는 향이란 대부분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방어물질이다. 동물은 이동이 가능하므로 불리한 환경에서 쉽게 벗어날 수 있지만, 한번 자리를 잡으면 이동이 불가능한 식물은 척박한 환경에서 자신만이 성장하기 위해 다른 식물이나 동물에게 해로운 물질을 분비하거나, 반대로 자손 번식을 위해 꿀벌과 나비를 유혹하기 위해서도 향을 풍긴다. 고추의 캡사이신, 마늘의 알리신, 큰 나무들이 내놓는 피톤치드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식물이 잘 자랄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에서는 나무는 잘 자랄지 모르지만 향은 약해진다. 그러니까 식물은 혹독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더 많은 향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는 들에서 캔 냉이와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한 냉이의 향을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다. 그래서 와인용 포도는 야생에 가깝게 재배해야 향이 풍부해진다.
기름진 토양에서는 포도나무의 활력이 너무 좋아서 향과 색깔이 약한 와인을 생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과감한 가지치기 등으로 성장을 억제시키면 좋은 와인을 생산할 수 있다. 또 포도나무 사이에 피복작물을 심어서 포도나무와 경쟁하게 만들어 포도나무의 뿌리가 옆으로 가지 않고 깊게 내려가도록 유도하기도 한다. 프랑스는 성장 기간에 포도밭에 물을 주는 것도 금지한다. 즉 척박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만들면 휘발성 성분이 더 많이 나오는데, 이를 우리는 그것을 향이라고 한다. 우리는 향이 좋다고 좋아하지만, 반대로 식물은 발버둥거리면서 살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고려대학교 농화학과, 동 대학원 발효화학전공(농학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Freesno) 와인양조학과를 수료했다. 수석농산 와인메이커이자 현재 김준철와인스쿨 원장, 한국와인협회 회장으로 각종 주류 품평회 심사위원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괴테(Johann Wolfgang von Goethe, 1749-1832)의 와인 사랑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프랑스 와인산업 현황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와인을 좋아한 '바흐(Johann Sebastian Bach, 1685-1750)'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바티칸 와인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기독교와 와인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토머스 제퍼슨의 와인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포트와인의 숙성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보르도 지방의 포도나무 제거 사업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유리병의 색깔이 와인에 미치는 영향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코르크나무가 껍질을 벗겨내도 죽지 않는 이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