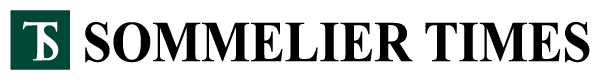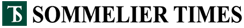와인에서 퀴퀴한 목재 썩은 냄새가 풍기는 경우, 이를 ‘코르키드(Corked)’ 혹은 ‘코르크 오염(Cork taint)’라는 말로 표현하고, 이 원인 물질은 TCA(2,4,6-trichloroanisole)라고 알려져 있다. 이 물질의 향은 와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광범위하게 퍼진 오염물질로 커피 등 다른 식품, 심지어는 수돗물에서도 나올 수 있다. 습한 환경에 익숙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냄새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지 않지만, 서양 사람들에게는 참기 어려운 향으로 분류된다. 그들은 TCA가 아주 미량으로 존재하더라도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와인에서 TCA의 최소감응농도(Sensory threshold)는 약 1.4~1.5 ng/ℓ 수준이니까, 국제규격 풀장에 티스푼 하나 정도 풀면 그 냄새를 인식할 수 있다는 말이다.
TCA를 비롯한 그 유사 물질에는 PCP(펜타클로로페놀), TCP(2,4,6-트리클로로페놀) 등이 있는데, 이 성분은 20세기 동안 제초제, 살충제, 살균제 등 농약 성분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고, 농업 분야뿐 아니라 목재, 골판지, 섬유 등 다양한 재료의 처리에도 사용되었다. 이로 인해 이러한 물질은 수십 년간 생태계에 잔류하거나 퍼질 수 있었으며, 코르크나무 혹은 토양에 축적되어 코르크 내 TCA가 형성된 것이다. 현재는 이 화합물의 사용이 금지되어 있지만, 이미 생태계는 이 물질로 오염되어 있다.
TCA 오염의 또 다른 경로는 목재에 존재하는 페놀(Phenol) 성분이 염소(Cl₂)를 만났을 때 나온다는 것이다. 페놀은 목재 내 리그닌이 분해되면서 형성되며, 페니실리움 곰팡이의 작용에 의해서도 생성된다. 이렇게 이미 페놀이 생성된 목재를 염소계 물질(예를 들면, 락스)로 처리하게 되면, 이 페놀이 염소와 반응하여 TCA가 생성된다. 예전에는 코르크판이나 오크 목재를 차아염소산칼슘(Ca(ClO)₂) 용액으로 표백하거나, 염소(Cl₂)가 포함된 수돗물로 나무껍질 판을 끓이는 과정 등이 있었다. 요즈음은 이런 공정이 금지되어 평균적인 코르크 오염 수준은 현저히 감소하였다.
그러니까 TCA 냄새는 코르크마개만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는다. 일부 와인은 플라스틱 마개나 스크루 캡으로 주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CA에 오염되는 사례가 있으며, 이러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고 오늘날에도 여전히 와인 생산자와 소비자들을 놀라게 하고 있다. TCA는 와이너리의 지붕 구조물, 벽, 바닥, 페인트, 팔레트, 오크통 등 다양한 목재와 자재에 존재할 수 있으며, 와이너리의 장비, 플라스틱 호스, 여과지, 벤토나이트, 오크통, 다양한 양조 기구 등에서 쉽게 오염될 수도 있다.
이렇게 TCA 오염 경로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TCA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단순히 코르크마개만 살펴 볼 것이 아니라, 와인 생산 전반에 걸쳐 그 오염 경로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이유로 일부 연구자들은 TCA에 오염된 와인을 표현할 때 ‘코르크 오염(Cork taint)’, ‘코르키드(Corked)’, '부쇼네(Bouchonné)' 등의 용어보다는 ‘곰팡이 냄새 오염(Moldy taint)’ 또는 ‘쾌쾌한 냄새 오염(Musty taint)’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20세기 말까지 와인 전문가들은 생산되는 와인 중에 5-10%가 TCA로 오염된 와인이라고 판단했으나, 요즈음은 1% 이하로 보고 있다. 코르크마개 제조업체는 코르크마개를 ‘증기 세척’, ‘열 탈착 공정’, ‘초임계 이산화탄소(CO₂) 처리’ 등 첨단기술로 처리하여 TCA를 최소감응농도(Threshold) 이하로 처리하고 있다. 생산자든 소비자든 이제는 TCA 문제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어쨌든, 현대 기술의 지속적인 발전으로 앞으로도 결함 있는 와인의 수를 줄여나갈 수 있는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고려대학교 농화학과, 동 대학원 발효화학전공(농학석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Freesno) 와인양조학과를 수료했다. 수석농산 와인메이커이자 현재 김준철와인스쿨 원장, 한국와인협회 회장으로 각종 주류 품평회 심사위원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관련기사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코르크나무가 껍질을 벗겨내도 죽지 않는 이유는?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유리병의 색깔이 와인에 미치는 영향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보르도 지방의 포도나무 제거 사업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포트와인의 숙성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토머스 제퍼슨의 와인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진짜 나무, 참나무(Oak)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짝통 와인의 전문가, ‘루디 쿠르니아완(Rudy Kurniawan)'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어떻게 해서 스포츠 우승자는 샴페인을 터뜨리게 되었을까?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곡식을 씹어서 빚은 술, 구작주(口嚼酒)
- [김준철의 와인이야기] 피노 뫼니에(Pinot Meunier)는 ‘키메라’